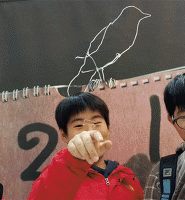티스토리 뷰


새해 인사 드립니다.
수백만 년 동안 조용히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간 모래톱 위를 나는 새들의 비행을 지켜보는 것은 이 지구와 마찬가지로 영원히 존재하는 대상에 관한 지식을 얻는 일이기도 하다. 이런 것은 인간이 바닷가에 나타나 경이에 가득한 눈으로 대양을 바라보기 훨씬 전부터 있었던 일이다. 몇 세기와 몇 세대에 걸친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왕국이 등장했다 사라지는 가운데 해가 가고 또 다른 해가 오면서 계속된 일이다.
[…] 그날 밤 늦게 눈이 내렸다. 태양이 두터운 구름층을 뒤로하고 어디론가 떨어질 무렵이었다. 곧이어 바람이 불어와 가장 두꺼운 깃털과 가장 따뜻한 모피도 뚫어버릴 차가운 물줄기처럼 툰드라를 휘감았다. 바다에서 불어온 바람이 비명을 지르고, 그보다 먼저 등장한 안개가 황무지를 지나갔다. 하지만 눈구름은 안개였을 때보다 훨씬 더 두텁고 더 하얗게 변했다.
[…] 눈 폭풍이 닥치자 황무지에 사는 생명체는 굶주림에 시달렸다. 뇌조의 먹이인 버드나무는 눈 밑에 파묻혔다.
[…] 다음 날 밤부터 바람이 바뀌더니 날씨가 풀리기 시작했다.
매일매일 눈의 장막이 점점 얇아졌다. 흰색 장막에 불규칙한 웅덩이가 생겨났다. 원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 대지에 갈색 웅덩이가 나타나고, 여전히 얼어 있는 연못이 점점 녹으며 초록색 웅덩이를 만들어냈다. 북극에서 녹은 눈이 바다로 흘러갔다. 구릉의 실개천은 시냇물을 이루고 급류가 되어 몰아쳤다. 그리고 들쭉날쭉한 수로와 협곡을 깎아내며 흘러 해안가 웅덩이에 모였다. 맑고 차가운 물로 가득 찬 호수는 새로운 생명을 쏟아냈다. 호수 바닥의 진흙 속에서 새끼 각다귀와 강날도래가 생겨나고 모기 유충이 물속에서 꿈틀거렸다.
레이첼 카슨, 바닷바람을 맞으며, 1941
티스토리 뷰
  |
우리 사회의 환경불평등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환경시민단체 환경정의와 함께한 텀블벅 펀딩 164% 달성으로 마감(https://tumblbug.com/ourhands)되었습니다.
모여진 기금은 환경정의가 진행하는 '안심마트 만들기 - 유해물질 관리 기업성적표' 프로젝트에 쓰입니다.
모든 분께 다정한 악수를 건네며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리워드로 진행된 작가와의 만남&철사로 손 만들기 워크숍의 자세한 후기는 환경정의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티스토리 뷰
촛불 핀 뱃지 Our Hands (Lapel Pins + Workbook)
좋아은경 2016
지난 해 손으로 만졌던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인가요?
올해는 나의 손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2016년 한 해동안 손으로 만지고 잡고 쥐었던 많은 것들을 되짚어보았어요. 그 중에서 가장 의미있던 것이 ‘촛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안에서 아주 오래 묵은 ‘손 쓸 수 없다’는 무력감은 조금씩 '우리 손으로 해 낼지도 모른다'는 가느다란 희망으로 바뀌어 갔어요. 광화문 광장 덕분이었죠.
광화문 광장의 시간과 만남을 오래 간직하고 기억하고픈 마음에서 작업하였습니다.
다시금 지칠 어떤 날에 위로가 되어주기를.
OUR HANDS는
를 바탕으로 제작한 두 개의 손 핀뱃지와 하나의 촛불 핀뱃지로 구성하였습니다. 더불어 자신의 손을 새삼스레 바라볼 수 있는 간단한 질문이 담긴 워크북으로 포장을 대신하였습니다.
* 이음책방(대학로)와 책방무사(종로구 계동)에 소량 입고되었습니다.
티스토리 뷰
좋아은경, 2014-
"철새의 이주, 썰물과 밀물의 갈마듦, 새봄을 알리는 작은 꽃봉오리, 이런 모든 것은 그 자체로 아름다울뿐더러 어떤 상징이나 철학의 심오함마저 갖추고 있다. 밤이 지나 새벽이 밝아오고, 겨울이 지나 봄이 찾아오는 일. 이렇게 되풀이되는 자연의 순환 속에서 인간을 비롯한 상처 받은 모든 영혼이 치료받고 되살아난다."
레이첼 카슨, 센스 오브 원더, 1965
"There is symbolic as well as actual beauty in the migration of the birds, the ebb and flow of the tides, the folded bud ready for the spring. There is something infinitely healing in the repeated refrains of nature — the assurance that dawn comes after night, and spring after the winter."
Rachel Carson, The Sense of Wonder, 1965
티스토리 뷰



2014-2015.
티스토리 뷰

손, 좋아은경
여기저기 손 볼 곳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도 레이첼 카슨의 글로 2015년 새해인사를 대신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눈으로 봄으로써 세상에 대한 지식을 얻는다. 그러나 아무리 시력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눈을 모두 뜨지는 못한다. 미처 보지 못한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그런 눈. 그런 눈을 뜨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간단하다. 스스로에게 늘 이렇게 물어보자.
"지금 보고 있는 이것이 내가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이라면? 지금 보고 있는 이것을 앞으로 다시는 볼 수 없다면?"
...나에게 그날, 그 자리, 그 광경은 한 세기에 한 번밖에 보지 못할, 아니 인간이 대지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이후 단 한 번밖에 볼 수 없는 그런 광경이었다. 물론 그날의 그 작은 땅이 언젠가 수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날이 올지도모른다. 또 그날 밤도 억겁의 세월 속에서 수없이 있어온 그런 밤이었을 수도 있다. 바닷가 오두막에서 불을 지피던 사람들에게는 늘 있던 평범한 밤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들에게는 고개를 들기만 하면 펼쳐지는 광경이 아름다움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고 앞으로 두 번 다시 보지 못할, 그런 광경이 아닐 테니까.
누군가의 마음이 우주의 인적 드문 공간을 한가롭게 거닐 때, 그런 순간을 아이와 함께하는 데 별자리 이름을 알 필요는 없다.
레이첼 카슨, 센스 오브 원더
티스토리 뷰

빈번히,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기계가 아니라 도움을 주는 손길이었다. "손 좀 빌려 드릴까요?"라고 이웃에게 건네는 말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곳 삶터의 습관과 지혜에 대해서도 친밀감이 생겨나게 하였다. 나는 우리 가족이 그 공동체 속으로 따뜻한 환대를 받으며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가 자주 "손을 빌려주는 데" 망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믿는다.
리 호이나키, 정의의 길로 비틀거리며 가다